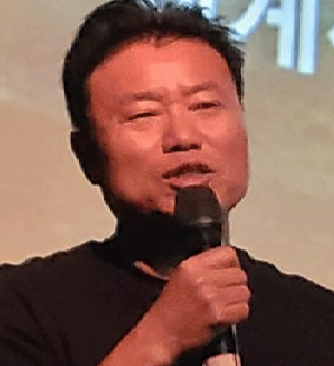 |
| ▲윤일원(부자는 사회주의를 꿈꾼다 작가) |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꽃이 있다. 배롱나무다. 나무에 매달려 하늘을 온통 짙은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배롱나무가 서 있을 자리는 산소가 아니라 서원(書院)이다.
 |
| ▲배롱나무@윤일원 |
이른 봄날 월출산 천황봉에서 바람재로 하산할 무렵, 낙엽 속에서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낸 얼레지는 가히 나를 숨 막히게 하고, 한여름 뙤약볕 더위에 짙은 열기마저 냉기로 다가오는 설악 공룡능선을 넘어갈 때 화강암 절벽 틈에 피어난 바람꽃은 내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게 하고, 양구 대암산 피의 능선 줄기 따라 흐드러지게 핀 한 무더기의 구절초는 처연한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준다.
옛 선비들이 배롱나무를 서원에 심은 연유는 단 하나 그의 품성 때문이다. 배롱나무는 더덕더덕한 나무껍질 대신 반질반질 한 기둥을 가졌기에 학문하는 사람도 반드시 발가벗은 자신의 품성을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심었지만, 사람마다 다른 나무를 선택한 것은 그들의 기품 때문이다.
퇴계의 수제자에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이 있다. 스승인 퇴계는 매화를 좋아하여 죽을 때 유언조차도 “저 매화에 물을 줘라.” 하였고, 학봉종택에 능소화가 가득한 것은 일편단심 능소화를 좋아한 듯하고, 서애는 병산서원에 온통 배롱나무밭을 만들었으니 배롱나무의 단아함을 무척이나 좋아한 듯하다.
학문은 모두 한 뿌리에서 시작하였으나, 뿌리가 자라 큰 거목이 될 무렵 서로 다른 품격을 보이는 것은 품성도 품성이지만 시대의 상황도 한몫한다.
 |
| ▲배롱나무@윤일원 |
퇴계가 은은한 매화를 좋아한 것은 그 시절이 평안한 시절이라 그러했으며, 학봉이 오뉴월 뙤약볕에 활짝 핀 능소화를 좋아한 것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기 때문이며, 서애가 배롱나무를 아낀 것은 한바탕 광풍이 전국을 휩쓸고 간 자리에 단아한 기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무릇 무엇이 무엇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필요하다. 부친 기일이 음력 6월 10일로 고향에 갈 적마다 연례행사처럼 찾아간 곳이 병산서원, 병산서원의 2대 명물인 만대루와 배롱나무를 보기 위해서다. 입교당 툇마루에 앉아 만대루 기둥 사이로 바라보는 단애(斷崖)의 아름다움은 가히 서애(西厓) 대감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도록” 만든 망족(忘足)의 원죄를 탓하지 않더라도, 또 툇마루 뒤편에 심어 놓은 배롱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병산서원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큰 누님 왈 “배롱나무는 꼭 공부하는 곳에 심어야 하지, 산소 앞에 심었다가는 딸들이 바람난다.”라는 말씀에 “오호라, 이건 또 무슨 기발한 발상인고?” 내 일찍이 뜻한 바가 있어 국방부에서 한평생을 보냈지만, 내 아들딸들은 기필코 여성가족부에 보내 “전국 집집 방방곡곡 산소 앞에 배롱나무를 심게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서언(誓言)하리라.
세상에는 음양의 이치가 있어 나 홀로 바람 나는 법이 절대 없는 법, 아들의 바람을 딸에게 덮어씌운 조선시대의 엉큼함을 내 일찍이 간파했노라. 옳거니. 좋다. 내 할아버지 산소 앞에 있는 어른 키 서너 배를 훌쩍 넘는 동백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아버님 산소 앞에 있는 금송도 파내어 여기에다 배롱나무를 심으리라. “그러고도, 네, 이놈들! 시집 장가만 안 가봐라. 그냥 확, 내쫓을 끼다.”
[출처 : 모닝포커스(http://www.morningfocus.net)]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